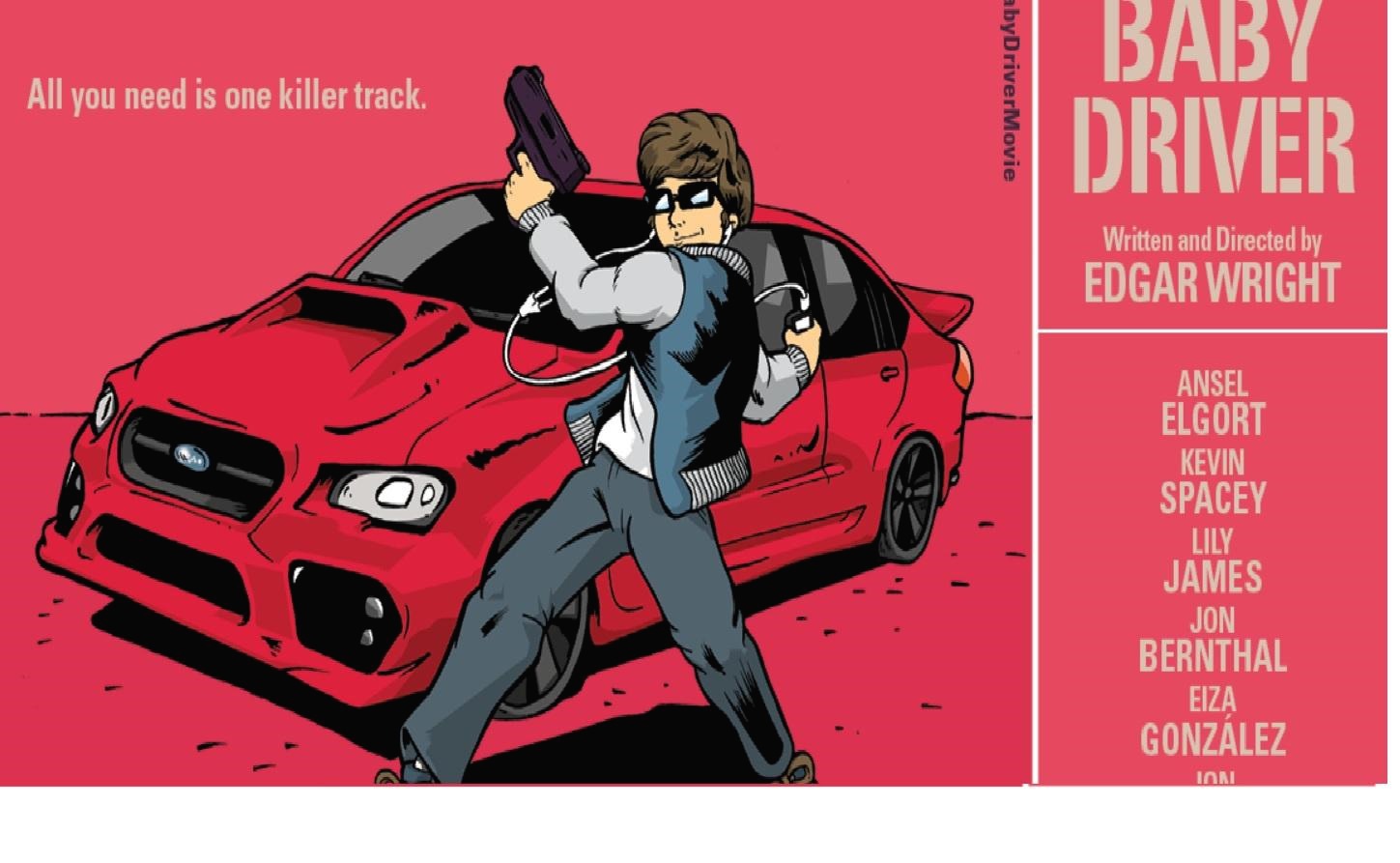세상에는 무서운 괴생명체 집단이 살아가고 있다. 그들을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의 소문은 익히 들어 알고 있다. 미세한 틈, 즉 창문사이의 틈, 문 사이의 틈 등 그 어떤 작은 틈이라도 발견되면 침입한다는 것이다. 일단 침입하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머리에 ‘이’라는 무시무시한 충균을 투척하여 모든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가려움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소문이다. 이들은 그 규모가 신출귀몰하여 그 난리를 순식간에 해치우기 때문에 일단 집안에 침입한 이상 그 어떤 무력과 그들의 행적을 막을 길이 없다. 한마디로 그들이 집안에 침입하였다 하면 일단 ‘쑥대밭, 이’라는 단어를 내뱉는 시간과 동시에 일사처리로 이미 상황은 종결되고 만 것이다. 너무나 순식간에 자행되는 일이라 그들의 용모며 행동거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저 ‘당했다’라는 세 글자로 소문은 겹겹이 쌓여가고 여기저기 공포의 아우성, 철두철미하게 묵묵하게 준비하는 든든함 등이 혼재되어 동네는 알 수 없는 칙칙한 아우라를 뿜어내곤 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예의 그렇듯이 당장 눈앞에 닥치지 않은 이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준비는 눈곱만큼도 하지 않았기에 그 칙칙한 아우라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나의 마음이라도 꿰뚫어본건지 우리 동네의 칙칙한 아우라가 눈에 띈 건지 빠르게 우리 동네에 출몰하였다. 모두들 ‘그래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하며 작정이라도 한 듯이 일사분란하게 모든 출입구를 닫고 미세한 틈조차도 허용하지 않은 특수 장치들을 여러 겹 쌓아 올리는 동네 주민들을 보고서야 ‘아차’ 싶은 마음에 나도 문과 창문들을 재빠르게(나름 내가 할 수 있는 재빠름으로) 닫아 보았다. 저들은 언제 저렇게 많은 특수 장비들을 구축했었는지 나로서는 감탄만 나올 지경이었다. 괴생명체들이 여기저기 훑고 지나가는 소리(일종의 강한 바람이 창문에 부딪히는 소리보다 약간 높은 강도이고 태풍이 몰아닥칠 때 나는 바람소리보다는 작은), 문을 부숴버릴 듯한 두드림 등이 더욱 가깝게 느껴졌다. ‘아, 이런 어쩌지 우리 집의 창과 문은 너무 틈이 넓은데 의자와 슈트케이스 등으로 막아야겠다.’ 라며 나는 온 집안의 의자와 슈트케이스 등을 총동원하여 현관문 앞을 막았다. 나름 나의 재빠르고 현명한(나의 판단으로는) 대처에 스스로 기특해하며 ‘이 정도 했으니 그들도 들어오는데 애는 먹겠지’ 라고 되뇌였다. 또한, 평소와 다른 나의 발 빠른 행동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다가 혹시나 그들이 우리 집을 발견하지 못하여(그럴 리는 없겠지만) 건너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미약한 희망을 가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나의 미약한 희망이 미약해서 그런지 괴생명체의 접근 소리는 점점 커져갔고, 우리 집의 현관도 여과 없이 쿵쿵 거리는 소리로 울려 퍼졌다. 그래도 나의 장애물들이 나를 지켜주겠지 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앉아있었는데 쿵쿵 거리는 소리는 두어 번 울리더니 바로 문이 너무나 쉽게 열리고 말았다. 아니 이렇게 쉽게 열리다니! 어차피 이럴 바에는 빨리 전략을 수정해야겠다. 그 어떤 누구도 괴생명체의 생김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으니 나는 아무 사전 지식 없이 괴생명체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들은 스머프처럼 온통 파란색이었으며 아트 슈피겔만의 ‘쥐’에 나온 쥐들처럼 생겼다. 또한 한두 명이 아닌 네다섯 명(명이라고 해야 할지 마리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이 쉽게 거실에 들어와 서있었다. 그들은 막 작전을 개시하려고 하는 것처럼 도끼를 하늘높이 치켜들고 아래로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외쳤다. “아! 정말 환영해! 여기저기 모든 집들이 모든 틈까지 다 세균박멸하며 강한 살균제와 특수재질의 제품으로 그 어떤 한 치의 틈도 허용하지 않아서 힘들었지? 우리 집은 정말 쉽지 않니?” 그러자 그들은 내리치려던 도끼를 내리며 나의 말에 정말 공감한다는 듯이 “정말 힘들었어. 아니 모든 집들이 그렇게 모든 틈조차 먼지하나 못 들어가게 막아놓으니 어디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런데 너네 집은 너무 쉽구나. 너무 쉬워” 그래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놈들 칭찬이나 해주고 나니 나도 모르게 기분이 우쭐해졌다.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 녀석들이랑 이런 시시껄렁한 대화나 하며 시간을 끌 수는 없을 게다. “자 그럼 어서 내 머리에 ‘이’를 빨리 뿌려줘” 그러나 신출귀몰하며 ‘쑥대밭, 이’ 라는 단어를 내뱉음과 동시에 모든 일처리가 끝났다는 소문과 달리 그들은 전혀 급할 것 없다며 거실을 느리적느리적 거리며 돌아다니고 있었다. “자 어서 나에게 ‘이’를 뿌려주고 끝내줘” 라고 나는 다시 한 번 자포자기 한 말투로 나지막하게 되뇌었다.